우리는 때로 선명함보다 흐릿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본다.
형태가 분해되고, 경계는 모호해지며, 모든 것이 잠시 자신을 감춘 공간.
분명히 존재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, 어렴풋 감각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밀도 같은 것.
나는 더듬어 보는 흐린 풍경 속에서 작업을 시작한다.
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순간마다, 그것은 꼭 안개를 걷는 시간 같다.
안개가 가득 낀 대관령을 걸을 때마다 나는 벅찼고, 종종 불안함은 무식한 용기가 되어 더 자유로웠다.
안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다. 제 형체를 선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들에게 마음껏 이름 붙일 수 있다.
그 순간만큼은 ‘궁극’ 같은 것도 사라지고, 우리는 각자의 정의를 스스로 그려나가게 된다.
정확한 답이 있다면 좋겠지만, 흐리게 볼 수 있음에 조금 더 무모하고, 용감하다.
흐릿한 장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표정을 새롭게 읽는다.
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감정, 잔상, 그리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.
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위해서는, 실제로 어느 정도는 흐릿해져야만 한다.
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바라본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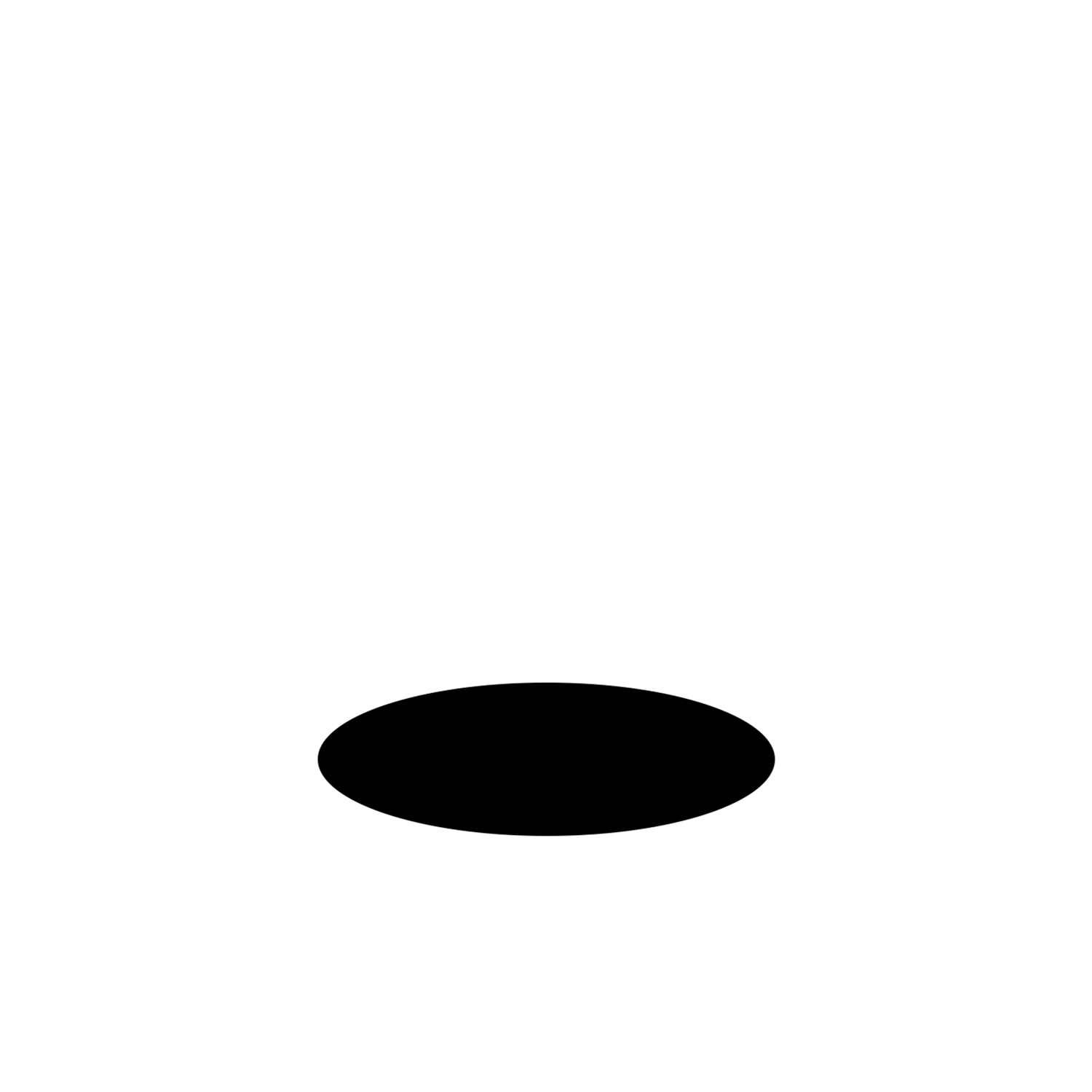
Leave a comment